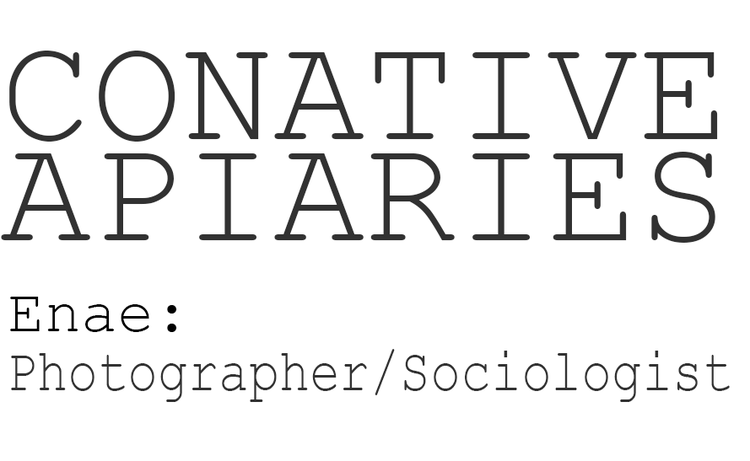Conative Apiaries - 능동형 양봉장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내 경우로 보자면 말로 할 때는 잔뜩 설명을 늘어놓다보면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임에도 글을 쓰다보면 이상하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게 된다. 그리고 그런 대상은 어떤 것들에 집중되는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르겠다. 그냥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건가.
어찌되었건 말은 서로의 표정을 바라볼 수도 있을테고 눈을 마주할 수 없는 전화라고 할지언정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말의 끝에는 늘 그 사람의 분위기와 기분이 감지되곤한다. 그런 차이 때문에 유독 글에 이런 너저분한 설명을 곁들이게 되는걸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 글모둠의 제목에 대해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 Conative Apiaries, 능동형 양봉집. 사회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 벌들의 기능적 사회는 현대사회의 이상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연적인 벌집hive도 아닌 양봉장Apiary은 벌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는 비슷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 언젠가 내 글들에서, 내 사진들로 부터 이런 차이에서 오는, 하지만 벌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사는 우리 세상으로부터의 다양한 변주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천천히.
오예 블로그!!!
벌써 몇번째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홈페이지, 블로그, 포트폴리오는 어느순간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각각 조금씩 쌓아둔 것들을 새로운 곳을 찾아 만든다는 이유로, 별로 한게 없다는 이유로 없애길 몇 번을 반복하고나서야 예전에 조금이나마 남겨뒀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생기기 시작했다.
의욕만 앞서서, 자신감만 가득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었던걸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런 것들을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했던걸지도 모르겠다. 뭔가를 사고 필요없어지는 것들이 있어도 제대로 버리지도 못하면서, 근15년간의 사진들을 외장하드 몇군데에 나눠서 보관해놓고서는 축적의 의미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게 아닐까.
지난 사진들을 잘 꺼내보지 않는다. 보통 3~5년이 지나면 그 이전 사진들은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을 세개의 외장하드에 똑같이 복사되어 보관된다. 그것들이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 무언가 쌓여간다는게, 쌓여서 특정한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걸까.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 지금의 내가 된 것일텐데.
* 새로운 도메인과 호스팅, 블로그와 테마 설치. 그리고 약간의 커스터마이징까지. 또 뭘 건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대로 한 번 가봐야겠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되었으니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
사람이 붐비는 식당에 가면 먼저 온 순서, 주문받은 순서대로 착착 음식이 나오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종종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십중팔구 여기저기서 '제껀 왜 안나와요?', '제가 먼저 온 것 같은데요'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마련이다. 뭐 그럴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저치보다 먼저 자리와 주문을 했는데 새치기 당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7분이란 식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스마트폰이 말해주는 대중교통 도착 알림 시간에 댈 수 있는건지, 눈코뜰새없이 바쁜 와중에 겨우 짬을 내어 먹는 식사가 만들어 낸 약간의 시간낭비가 겨우 낸 시간을 축내는 것이 몸서리쳐지게 싫은 것인지,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직장상사의 괜한 농담에 괜히 짜증이나서 그 약간의 시간에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각자의 사정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꺼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 시간들은 모여서 어디로 가는걸까. 이런 시간들을 한군데 모두 모아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걸까. 시간을 품앗이 하는거지. 그럼 다들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시간 좀 낭비한다고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텐데 말이다.
'As I told,'
언젠가부터 '말했듯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많은 길을 이리저리 헤메오면서 는 말이 비단 이 말 뿐이겠느냐만 문득 누군가 심할 정도로 자주 쓰던 '내가 보기에'이라는 말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그 말을 안쓰려고 했던 생각이 났다.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렇게까지 확인이 필요할까.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다시 한 번 말하면 되는걸.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 여유를 가지면 될 일도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겠지. 그런데 여유를 가져도 될 일은 되고 여유가 없어도 안될일은 안된다. 그렇게 그냥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