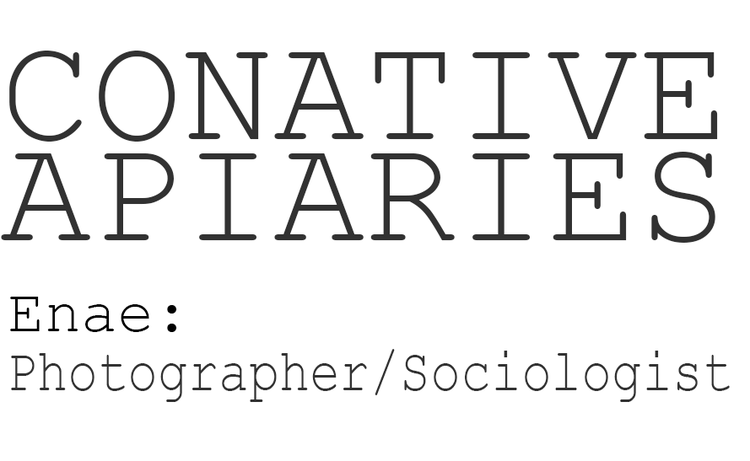지금 있는 이 곳에서 '필름'이라는 단어는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그리고 내게는 여전히, '필름'이라고 하면 '사진'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내 카메라'가 있었지만 장농 구석에 꽁꽁 숨겨져 소풍을 갈 때나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꺼낼 수 있었으니 그것이 진짜 '내 카메라'였을까 하는데는 의문이 있지만 어린시절 외삼촌이 카메라를 빌려간다고 했을 때,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걸 보면 그 카메라를 무척이나 소중히 생각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외삼촌은 카메라를 고장을 냈거나 분실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름을 한롤 사서 카메라에 넣고 필름이 든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린 나에게는 무척이나 신성한 행위였다. 필름은 값비싼 것이었으며 모처럼 얻은 간식처럼 아껴서 써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 쓴 후에는 쑥스러운 얼굴로 사진관 아저씨에게 맡기고선 도망치듯 사진관을 나와 그날 밤을 설렘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이었다. 여전히 필름을 맡기던 동네 사진관의 모습이 생각난다.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그런 평범한 사진관이었다. 입구에는 증명사진과 가족사진, 졸업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높은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가 계셨고 그리고 카운터 옆 틈을 통해 가면 알수 없는 어둠 속에 검게 빛나는 카메라가 놓여져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었다.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동네의 기억 중에 사진관이 남아있는걸 보면 내게 무척 신기한 곳이었거나 중요한 곳이었을것이라고 생각해본다. 필름은 여전히 오래걸린다. 그리고 비싸다. 사진을 즐기는 이들은 늘어났지만 요즘은 필름 종류마저 많이 줄었고 가격은 그만큼 올랐다. 어쩌면 취미로 하는 필름은 과거의 권위Authority나 진실성Authenticity을 찾는 부르디외가 말하는 진짜 중간계급의 예술이 된걸지도 모른다. 사실 요즘 시대에 필름을 쓰는 장점은 그리 많지 않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객관화된 수치들도 많지만 일단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때 요즘 나오는 디지털이 대개 필름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준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135포맷 필름은 디지털에 따라 잡힌지 오래고 120포맷 필름도 디지털보다 크게 낫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135포맷의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할 때의 이야기이고 동일한 120포맷으로 볼 때는 디지털이 더 낫다고 말하는 편이 맞는 것 같다. 물론 이건 컬러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출력(인화)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웹상으로 볼때라면? 무조건 디지털이 낫다. 필름으로 디지털로 찍은 것처럼 만들기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다. 물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은 디지털보다 나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라면 그 수고를 기울이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필름이 디지털보다 낫다고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 컬러 필름을 암실에서 프린트해 본 사람은 알꺼다. 암실에서 작업한 사진이 나왔을 때 그 컬러의 다양함과 깊이. 화학적 반응과 전자기적 반응의 차이를. 하지만 컬러 필름을 아날로그로 프린트해보면 디지털의 편리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컬러필름을 아날로그로 뽑는다는 말은 후보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가깝다. 닷징(밝게 하기), 버닝(어둡게 하기)이 가능한 흑백필름과 달리 컬러필름은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심과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한다.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하다. 즉 가능한 일은 색의 균형을 맞추는 것 정도이다. 과거에 왜 그런 수많은 컬러 필터들이 있었을까. 그 많은 컬러필터들은 단순히 흑백 사진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애초에 찍을 때 잘 찍어야 제대로 된 프린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스캔해서 프린트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필름을 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필름을 아날로그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기가 싫다. 컬러 인화지는 이제 몇 종류 나오지도 않고 고급 잉크젯용 프린트 용지처럼 두껍지도 고급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하며 그 색 또한 여전하다.
사진은 뽑아야 맛이라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내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다. 사실 사진을 많이 뽑진 않는다. 작업 할 때나 뽑지 실제 프린트하는 사진은 별로 없다. 그래도 밀착은 언제나 한다. 그리고 필름과 같이 보관한다. 디지털로 찍은 사진들은 이상하게 관리가 되질 않는다. 좋다고 하는 툴도 웬만큼 써봤다. 백업도 늘 2중, 3중으로 열심히 한다. 그런데 1년 전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들쳐보는건 밀착과 함께 있는 필름들이지 하드드라이브가 아니다. 어쩌면 이건 내 파일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이 어느날 갑자기 인식이 안되면 어쩌나하는 불안함은 늘 있긴하지만 손에 잡히는게 있는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는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글에 썼듯이 예전 필름들은 시간순서대로 그대로 쌓여서 정리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 사실 그 안에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대충만 알 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다. 시간 순서대로 쌓여있으니까.) 필름으로 일상을 기록한다는건 이런게 아닐까 싶다. 그저 내 시간들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한 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지금 당장 보지는 않더라도 어느새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내 기억의 한켠을 조그마한 공간에 남겨두는 것. 비록 남들처럼 그날 찍은 사진을 그날 확인할 수도 없고 때론 필름 한 롤에 며칠이, 몇 달이 기록될지언정 내 뒤를 지켜주고 있는 다른 기억이 있다는 것.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것. 이런게 필름으로 기록하는 일상의 모습들이다. 생각해보면 꼭 그날 일을 그날 올려야할 필요는 없는것 같다. 필름을 쓴다는건 그런거니까.
덧. 작업을 할 때 실제 촬영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다만 사전 준비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걸릴 뿐이다. 필름으로 작업한다는건 여러 변수들을 통제해야 하고 촬영 후에 보정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변수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가능한 상황에 대해 가급적 많이 테스트를 거친다. 그리고 실제 촬영에서는 기존에 쌓아둔 데이터를 활용한다. 어쩌면 나는 이런 과정들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