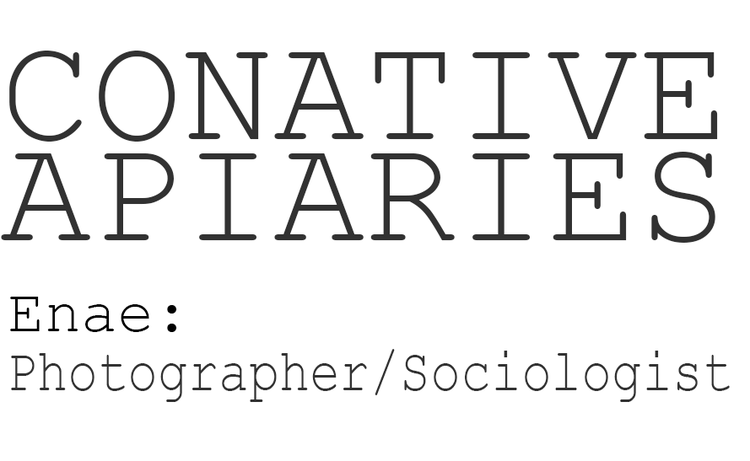Shopping cart - from Instagram
개인의 사연들
Will my life be different then?
작은 바위섬은 물에 잠겼다가도 모습을 드러내고, 눈 앞에 있다가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삶은 바위섬이라기보다 물안개와 같아서 기다려도 보이지 않고 예기치않게 나타났다가 흔적없이 사라진다.작은 바위섬은 물에 잠겼다가도 모습을 드러내고, 눈 앞에 있다가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삶은 바위섬이라기보다 물안개와 같아서 기다려도 보이지 않고 예기치않게 나타났다가 흔적없이 사라진다.
Today - from Instagram
Port - from Instagram
. - from Instagram
Commercial temple - from Instagram
Tiny forest - from Instagram
Sky - from Instagram
세번째 여권, 세번째 비자
세번째 여권, 세번째 비자 신청 그리고 두번째 학교. 뭔가 참 멀리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 실제로도 먼길을 돌아 헤메고 있었다. 그 시간들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내게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요 며칠간의 불안과 긴장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세개의 여권을 보며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가장 오래된 여권에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미국 비자가 남아있고 두번째 여권에는 두 개의 영국 비자가, 마지막 여권에는 새로운,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의 흔적이 남아있다.
언젠가부터 '예전의 나는'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당당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던간에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자신 있었고 자랑스러웠다. 어쨌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주 가끔 떠오르는걸 제외하면 요즘엔 별로 그러지 않지만 이것 역시 지금의 나이니까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의기소침해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나를 일부러 피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까짓 지금이 좀 아니면 어떤가. 또, 아닐것도 없지 않나.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가자. 걍 고. 이왕이면 즐겁게, 신나게.세번째 여권, 세번째 비자 신청 그리고 두번째 학교.
뭔가 참 멀리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 실제로도 먼길을 돌아 헤메고 있었다. 그 시간들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내게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요 며칠간의 불안과 긴장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세개의 여권을 보며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가장 오래된 여권에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미국 비자가 남아있고 두번째 여권에는 두 개의 영국 비자가, 마지막 여권에는 새로운,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의 흔적이 남아있다.
언젠가부터 '예전의 나는'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당당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던간에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자신 있었고 자랑스러웠다. 어쨌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주 가끔 떠오르는걸 제외하면 요즘엔 별로 그러지 않지만 이것 역시 지금의 나이니까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의기소침해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나를 일부러 피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까짓 지금이 좀 아니면 어떤가. 또, 아닐것도 없지 않나.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가자. 걍 고. 이왕이면 즐겁게, 신나게.
Windy day - from Instagram
빈공간
사람들을 위한 공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활용 가능한, 하지만 활용되지 않는. 각자의 숨결이 묻어나는 각기 다른 냄새의 공간.사람들을 위한 공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활용 가능한, 하지만 활용되지 않는.
각자의 숨결이 묻어나는 각기 다른 냄새의 공간.
부산 영화의 전당
부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에 4년을 살았고 부모님도 꽤 오랜 기간 살고 계시기에 친근한 곳이긴한데 여전히 부산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중학교 시절에 돌아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고 대학 이후에도 집에 내려가면 동네나 돌아다니지 어디 멀리 다니질 않았기에 어쩌면 모르는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조금 다녀보니 나름 재밌고 매력적인 공간이 많아보인다. 영화의 전당(Busan Cinema Center) 또한 그 중 하나인데 저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말들이 많았었나본데 그 사실을 떠나서 공간 자체가 계속 잘 운영되어 정말 멋진 곳으로 이어져나가길 바라본다.
/설계: Coop Himelblau(AUS) + 희림건축사무소
Coop Himelblau의 건축물을 좀 찾아봤다. 해체주의로 명성을 얻은 집단이라하는데 역시나 해체주의 건축은 내 취향은 아니다. 뜬금없이 드는 생각. 공간과 건축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책에 줄을 긋는다는 것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책에 밑줄을 긋거나 귀퉁이를 접어두거나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한다. 물론 가끔 엄청난 흔적이 몇 책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경우 또한 교과서이거나 문제집일 경우일 뿐이다. (교과서나 문제집도 풀었다는 흔적조차 잘 남기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께 '넌 왜 그리 책이 깨끗하냐. 공부를 하긴 하는거냐.'라는 핀잔을 자주 듣곤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나로써는 매우 억울한 순간이었다. 게다가 이런 핀잔은 성적이 잘나와도, 익숙해질법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았다.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외화 동전 몇개를 몰래 은행에서 바꿔와 용돈으로 요긴하게 썼던 내가 책도 중고로 팔 수 있음을 알고 그랬던 것일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보던 안보던간에 내가 가진 책을 중고로 처분했던적은 올 초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밥을 사먹겠다는 이유로 팔았던 그 한번이 전부니까. 차라리 누굴 주거나 버렸으면 버렸지 판 적은 그 한번이 전부다.
아마도 뭐든 잘 버리지 못하는 까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 왜 늘 나는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버리는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책을 사기위해 쓰는 돈도 많고 부모님은 가끔 책 읽는걸 말리기도 하신다. 정말로 나보다 많이 읽는 사람들도 많고 책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은 별로 부럽지 않다. 양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도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서로의 관심사는 다른거니까. 그래도 소위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 중에 매우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똥차게 인용해내는 사람들. 물론 이런 이들은 적합한 곳에 잘 인용했을 경우를 말하는거긴 하지만 이런걸 능숙하게 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잘한다. 책의 내용이나 감상 등을 얘기해보자고 하면 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죽어도 인용이 안된다. 그래서 나름 노력한다고 책 내용을 노트에 베껴써놔보기도 했다. 힘들더라. 옮겨 적는 일도 생각보다 무척 고된 일이고 그 시간에 한번 더 읽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요약해서 적어두면 더 좋겠지만 그건 왠지 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손목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건 기껏 적어둔 것들이 어느 노트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거다. 그거 정리하려고 또 노트를 만들거나 피씨를 열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이런 관리에 능숙하지 않은게 아닐까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다른건 다 관리가 잘 되는데. 적어둔, 기억하고 싶은 글들 보다 훨씬 많은 내 이미지들이 그걸 증명해주는게 아닐까 한다. 어쨌든, 오랜 관찰 끝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대개 책을 깨끗이 보지 않더라. 그렇다고 너덜너덜하게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만든다는게 아니라 나름 그들의 법칙대로 줄을 긋고 표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따로 정리도 하더라. 문득 내 킨들이 떠올랐는데 킨들로 읽는 책에서는 줄도 잘 긋고 Archiving도 엄청 잘한다. 다시 찾기도 잘 찾아내고. 그런데 종이로 읽는 책은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거나 따로 입력하고 싶지는 않더라. 이 무슨 해괴한 성격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줄을 한 번 그어보기로 했다. 줄만 긋고서 또 관리가 안되어서 책을 더럽혔다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어보고 관리해봐야겠다. 하다보면 이것도 늘겠지.
덧)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다녔던 학원 국어선생님이 날 많이 이뻐해주셨다. 성함도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분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책을 더럽히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책은 소중한거고 책은 빌려 읽지도 말고 빌려 주지도 말라고. 빌려 읽는 것도 여전히 잘 안되는 부분이고 빌려 주는 대신에 그냥 한권을 더 사서 선물하고 만다. 책을 어떻게 다뤄야 더 소중히 다루는 걸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255.255.255
취미로든 직업으로든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255.255.255라는 숫자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필름카메라로 찍었던 디지털카메라로 찍었던간에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대개 R, G, B 각각의 채널에 부여된 0에서 255까지의 조합으로 색과 밝기가 결정된다. 255는 색정보가 전혀 없다는 말이며 세 채널 모두가 255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순수한 흰색이라기보다 아예 색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이것 자체가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되기도 한다.
적어도 색과 관련한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향 때문에 이 부분에 무척이나 집착하던 시절이 있었다. 색과 계조. 하지만 어느새 이미지는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소비되고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이미지도 결국은 모니터를 통하게 된다. 모니터상에서 255.255.255와 254.254.254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 맘 먹고 구분하라그러면 구분할지도 모르지만 이미지의 소비 방식을 생각해볼 때 일부러 찾겠다고 마음 먹지 않는한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테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하얗게 날아가버린 부분은 복구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름을 쓰라는 사람들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필름으로 찍은들 새카맣게 된 필름을(필름에선 밝은 부분일수록 어둡게 나온다.) 스캔하면 대부분은 그냥 비슷한 사진이 나온다. 아주 좋은 스캐너로 신경써서 스캔하면 살릴 수 있긴하지만 어차피 디지털화한다면 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좋은 스캐너가 집에 갖춰진 사람도 얼마 없을뿐더러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걸 스캔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다. 물론 필름으로 직접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하겠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것은 어쩌면 필름에 대한 약간의 환상 또는 향수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버렸다. 255.255.255가 중요하게 작용할 때는 실제 종이에 프린트할 때고 프린트 할 때 저 부분은 약간의 작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니 이 부분에 너무 괘념치 말자. 잘 나오면 더 좋은건 당연한거겠지만 좀 날아가면 어떤가. 그 순간은 이미 내가 갖게 되었는데.
덧) 필름으로 사진을 시작하고 배운 사람들은 사진을 밝게 찍는 습관이 있고 디지털로 시작한 사람들은 사진을 어둡게 찍는 습관이 있다. 필름은 어두운 부분을 살려내기가 어렵고 디지털은 밝은 부분을 살려내기가 어렵다. 둘 다 함께 사용하다보면 난감할 때가 있다. 이것도 습관이니까.